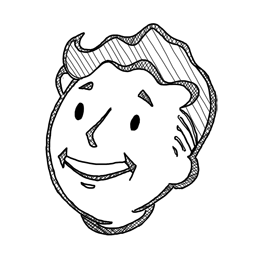소녀와 노을
광풍에 잘게 부서진 갯물이 풍경의 볼을 때리고 일식이 일어난 듯 갑자기 어두워진 간월암, 소녀는 참 죽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을 했다. 육신은 물론 영혼마저 억겁으로 날려 보낼 수 있는 평소에 늘 꿈꿔왔던 최적의 장소가 가눌 수 없는 몸 앞에 짙은 암회색으로 펼쳐져 있는 것이다. 어떻게 죽어야 할까,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떨쳐버린 지 이미 오래, 하지만 실행에 옮길 방법이 여태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소녀는 그제야 인식한 것이다. 준비해 다시 오리라, 소망한 대로 죽을 수 있는 곳을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크나큰 위안, 석등 속 촛불처럼 숨죽여 안도하는 소녀를 눈치 챈 사람은 그날 일행 중 아무도 없었다.
내가 소녀와 함께 간월암을 다녀온 게 대략 일 년 전, 그때 함께 했던 일행 중 한명으로부터 소녀가 죽기 위해 간월암엘 다시 갔었고, 다행히 죽지 않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건 지난 초겨울. 전하는 이는 술좌석의 지나가는 말투처럼 가볍게 했지만, 난 흘려듣는 척했지만, 둘 다 충격적인 내심을 감출 수는 없었다. 아니, 공감에서 비롯된 강한 동질감 같은 것이었다.
짐작컨대, 소녀가 죽지 않고 돌아온 건 일 년 전 그날과는 달리 평온한 바다의 선명한 노을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. 변화무상한 삼라만상을 보았을 것이고, 무엇이든 변한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-無我-를 향한 나름의 숭고한 과정이며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슬프지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름다운 속죄라는 생각이 불현 듯 들었을 것이다. 인위적 죽음이나 생명연장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하나를 향한 아름다운 속죄의 그 숭고한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확신이 생겼을 것이고, 죽음에 대한 그 어떤 권한도 이 땅에 태어날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겐 주어지지 않았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을 것이다. 그동안 정리할 수 없어 죽을 만큼 괴롭던 ‘왜 사는가?’가 한순간에 정리됐기 때문일 것이다.
얼마 전 우연히 솔숲에서 만나 날 따뜻이 포옹한 소녀. 그녀에게 죽음이란 더 이상 자유의 담보가 아니었고, 나는 보지 못해 알 수 없는 간월암의 노을이었다.
소녀가 부럽다.
※ 이 글이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여기에 옮겨놓는다.
사무치게 외로울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당혹스럽게도 남자였다. 그가 남기고 간 이 글은 지난 몇년간 만난 어떤 글보다 아름다웠고 내게 가슴 시린 위안을 주었다.
변산, 2014.6.